Mobile Menu, Mobile S-jokes, Cyber World Tour,
글 수 39
2024.4.19 19:57:41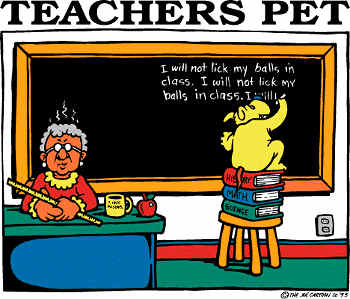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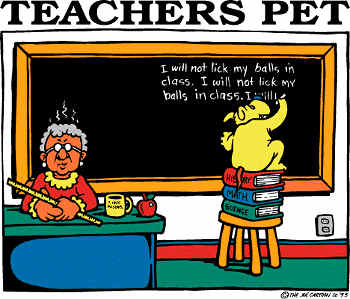
백수의 사랑이야기 3부 (7) 하숙집에선 주인 아줌마와 그녀가 아까 사가지고 온 생선들을 다듬고 있다. 치마를 모으고 앉아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정성스럽게 생선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이 참 여자답다. 괜시리 그녀가 좋아지네. 그렇지만 그녀와 난 신분이 다르다는 걸 상기하자. 상처 받기 싫으면 말이다. 오후가 깊어 간다. 별로 하는 일도 없지만 일요일 오후는 가슴이 아프다. 지는 해가 참 서글프게 느껴진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는 외롭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외롭다. 티비에서는 프로야구 중계를 하고 있다. 엘쥐하고 오비하고 하고 있다. 나는 당연히 엘쥐 팬이지...(왜? 이 글 쓰는 놈이 엘쥐 팬이기 때문이다. 이 글 읽는 사람중에 혹시 오비팬이 있는 줄 안다. 이제부터 오비를 좀 씹겠다.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음. 하기야 지금은 두산으로 바꼈지 참.) 대전에 있던 촌놈들이 괜히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참내. 유니폼 봐. 졸라 컨추리 하네.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프로야구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 여유 를 찾자. 니가 그렇게 안타를 쳐버리면 내가 속상하지. 여유 좀 찾자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점점 승부는 오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똑, 똑." "누구세요?" "이집 주인 딸인데요." 딸이라야 자기 하나면서 노크 할 때마다 자신을 칭하는 용어가 참 다양하다. "왜요?" "좀 쉬려구요." "쉬는데 왜 내방을 노크하는데..." 그녀가 들어 왔다. 마치 자기 방이라도 되는 양, 들어 오라는 소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들어 왔다. "티비 보는구나. 진짜 불쌍하다." "뭐가요?" "일요일날 외출하는 꼴을 못 봤어. 오늘은 날씨도 참 좋은데..." 왜 앉아요? 편히 혼자서 야구 좀 보겠다는데... "생선 절이는 것은 다 했어요?" "네." "어머님은요?" "방에 들어가셨어요." "여긴 왜 왔는데요?" "심심해서요." 내가 심심풀이 너츠냐? 또 비디오를 보러 왔나 싶다. 비디오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나 사지. "심심하면 남자 친구랑 데이트나 하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어머, 이젠 이런 말도 쉽게 나오네." "쉽게 나오면 안되나요?" 그녀가 바로 나갈 것 같지가 않다. 치마를 훔치며 자세를 편하게 하는 폼으로 봐서 여기서 꽤나 놀다 갈 것 같다. 싫지는 않지만 난 글을 쓰지 않을 때, 생각이 없을 때는 혼자 있고 싶다. 그냥 아무것에도 의미를 주지 않고 지나는 시간을 옆에서 멍하니 구경하고 싶다. 혼자서 생각이 없을 때는 편하다. 아직 내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생각이 없을 때가 편하다. 그런데 자꾸 하숙집 그녀가 방해를 한다. "이런말 쉽게 나온다는 것은 그사람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잊혀 지는건 서러운 것이에요." "아직 그래도 생각이 나나 보네요.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어, 야구 하네. 야 오비경기다." 그래 내 말은 그렇게 씹어라. 티비와 내 모습을 차근히 번갈아 돌려 본다. 무슨 듣기 안좋은 말을 할 것 같다. 오늘도 아픈 곳 찔러 봐라. 아침에 시장도 같이 봐 주었는데 놀리면 가만 안 있을겨. "예, 야구 좋아해요?" "그럼요. 보아하니 엘쥐 팬일 것 같네요." "네? 보아하니 엘쥐 팬이라니요?" "백수들이 엘쥐를 좀 좋아하더라구요. 전 깔끔한 이미지의 오비를 좋아하지요." 또 놀렸다. 두 살이나 어린게 말끝마다 백수라 놀리며 맞먹는 것을 넘어서 아예 아랫사람으로 날 취급한다. 하기야 아랫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냐. 참을까? "그래요? 남자한테 차인 여자들은 오비를 좋아하더군요." "오비 선수들은 다 잘생겼으니까 좋아 할 수도 있겠죠. 주위에 남자한테 차인 여자들이 오비를 좋아하던가요?" 뭐여? 지 예기 하는데... 그래 난 그녀가 상류층 신분임을 간과했었구나. 그녀를 멀뚱히 쳐다 봤다. "나영씨 기분 안 나뻐요?" "뭐가요?" "차였다는 말 애써 했는데..." "나 얘기였어요?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맞지 않는게 있어서 헤어진 것이지 누가 차고 차이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굳이 누가 찼냐고 따지면 내가 그를 찬 것이겠지요. 그 사람 아직 날 못 잊고 있을걸요. 호호, 그럴거에요. 아, 날 놀리려고 한 말이구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들어 올 때처럼 밝지가 못하다. 계속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냥 그런 그녀의 표정에 기분이 나쁘다. 씨. "야호. 오비가 또 점수를 뽑았다." 오비 새끼들 뭐 이긴 거 거의 결정 났는데 또 점수를 뽑고 그러냐. 징한 놈들. 요 몇년 새 계속 시즌 초반에는 우승후보로 꼽히다가 끝에는 쌍방울 보다도 못하는 새끼들. 그래 얼마나 이기고 싶었겠냐. 어제, 그제 엘쥐한테 연패 한 거 내 알지. 근데 하필은 그녀가 있는데서 저러냐. "안가요?" "어딜요?" "나영씨 방에요." "야구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야구는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가 중단 되었다. 점수는 아홉점 차이였다. 그녀의 실실 웃는 모습이 참 얄밉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에요?" "뭐 먹고 싶은데요?" "예? 지금 시간이 몇신데 아직 반찬 결정도 안했단 말입니까?" "물어 보도 못하남. 그럼 나중에 봅시다. 나는 밥하러 갑니다. 오비가 점수 뽑는 거 더 봤어야 하는데..." 그녀가 일어서 내 모습을 보며 비웃고 나갔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냥 아프다. 일요일 밤은 월요일 새벽으로 변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안에서 책을 펴 놓고 컴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날리는 담배 연기 속으로 내 외롬과 고민을 날려 버렸음 좋겠다. 커서는 아까부터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생각이 아플 땐 그리운 것이 떠 오른다. 외롬과 고민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수도 있었으나 그리운 것을 떠 올리면 내 아픈 생각을 비켜 가게 해준다. 괜히 미소가 맺혔다. 뭐여? 왜 하숙집 그녀가 생각이 났는데 미소가 맺힌겨. 어라, 그녀가 자는 모습이 또 궁금하네. 혼자 있는 것 같은 밤에는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을 스쳐 간다. 그녀와 함께 사는 집인데 그녀가 그리울리 만무하다. 스쳐가는 것이라 생각하자. 깜박 졸았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는 인기작가다.'라는 문구의 3D 글자가 돌아 다니고 있었다. 스크린 세이버다. 그래 난 인기 작가가 되어야 한다.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시계는 새벽 네시를 먹고 있다. 자야 겠구먼. 그래 내일의 인기 작가를 위해서 오늘은 이만 자자. "쾅! 쾅!" "왜요?" "밥 먹어요. 나 오늘도 시장가야 돼요." "안 먹을래요." "굶으면 백수씨만 손핼텐데. 빨리 나와서 먹어요." 시계는 아홉시를 갓 넘겼다. 졸라 이른 시간이다. 추리닝을 껴 입고 나갔다. 아직 학교로 가지 않은 현철이란 녀석과 주인 아줌마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내 밥도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내 밥 옆의 밥은 그녀 것이겠지.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그래. 어여와 밥 먹어." "네."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주인 아줌마가 그녀와 나란히 앉은 나를 보시며 옅은 웃음을 지으신다. "오늘은 병원 안 가셔도 되요?" "안가도 되는데 얘가 가라고 그러네." 아줌마가 그녀를 쳐다 보시며 답을 했다. 아줌마의 모습이 내가 이 하숙집을 처음 왔을 때의 모습보다 확연히 초췌하시다. 남이라면 남일텐데 괜히 걱정스럽다. "어머님 혼자 가실거에요?" "혼자가도 돼. 얘가 오늘은 바쁠거야." "빨리 나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맛있는 반찬 얻어 먹지요." 일찍 일어 난 것이 억울해서 그녀에게 시비를 걸었다. 아무말 없이 밥 잘먹고 있던 그녀가 나 대신 맞은 편에 있던 현철일 쏘아 보며 말했다. "맛 없냐?" 현철인 나와 그녀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예전의 어머님이 주시던 국이랑 반찬 보다는 맛이 없잖아 임마. "동엽씨 밥 먹기 싫어요?" "안먹는다고 했잖아요. 괜히 깨워 가지고서리."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손으로 잡고 답을 했다. 일단 일어났으니까 밥은 먹어야 겠기에... 아줌마의 모습에서 재밌다는 표정이 비추어 졌다. 괜히 아줌마를 보며 웃어 주었다. "그래, 나영이 하고 친하게 지내 주어서 고마워." 이런게 친한 것인가? 내 옆의 그녀의 표정이 정다워 보인다. 이렇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괜찮다. 하숙집 그녀는 시장을 가고 없었다. 점심때가 지나서 아줌마가 병원 가실 채비를 하셨다. 아침을 좀 일찍 먹었더니 배가 고프다. 나가서 밥이나 먹을까,하고 방을 나왔다가 아줌마가 병원 가시는 걸 보았다. 걸음 걸이는 괜찮았으나 떠시는 손이 불아해 보였다. 학원을 좀 일찍 가지 뭐. "어머님 병원 가시는 길이죠?" "응." "저랑 같이 가시죠. 어짜피 저도 학원 가야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려." 옷을 갈아 입고 학원 갈 준비도 마치고 방을 나왔다. 아줌마가 현관 앞에 앉아 계셨다.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가도 되겠지요?" "허허, 괜찮겠어? 혼자 가도 되는데..." 아줌마의 걸음 걸이는 나보다 많이도 느렸다. 보조 마추기가 힘들었으나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보다는 좋다라는 느낌의 아줌마가 지으시는 미소 때문에 싫지는 않았다. "자네 같은 아들하나 있었음 참 좋겠다." "아들 같은 따님이 계시잖아요." "내 딸이 아들같아 보였나?" "예?" "하기야 좀 섬 머슴애같이 보이는 면도 있긴 하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따님이 아들 하나 쯤은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저같은 사내 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말이죠." "말은 고마운데 자내를 너무 낮추지는 말게. 자네 놀고 있다고 어떨 때 보면 많이 기가 죽어 보여." "그렇게 보였어요?" "흠."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신다. 딸도 내 말을 자주 씹는데, 내 나이가 저런 웃음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어린가? "병원에서는 많이 좋아지신다고 하던가요?" "나 말인가? 내 나이가 뭐 좋아지고 그러지는 못하겠지. 그냥 더 안나빠지라고 다니는 거야. 영이 시집은 보내고 죽어야 될텐데." "좋아지실 거에요. 그리고 나영씨야 뭐 곧 시집을 가겠지요." "그래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야 될텐데." "좋은 사람 만날거에요." "자네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하하. 전 백순데요." "기죽지 말라니까." 늦 봄의 따스한 햇살이 하숙집 아줌마의 이마에 내리고 있다. 나에게는 나지 않는 땀이 그 이마에는 많이도 맺혀 그 나리는 햇살을 먹고 있었다. 하하,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신다. 같이 걷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모습 너머로 그녀가 떠올려 졌다. 으이쒸, 또 미소가 맺혔잖여. 8회에서 계속... -------------------------- 원작자: 이현철 |
 History,
UNESCO Heritage, Tour Place,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Paintings,
History,
UNESCO Heritage, Tour Place,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Paintings,
(*.150.229.138)
|

